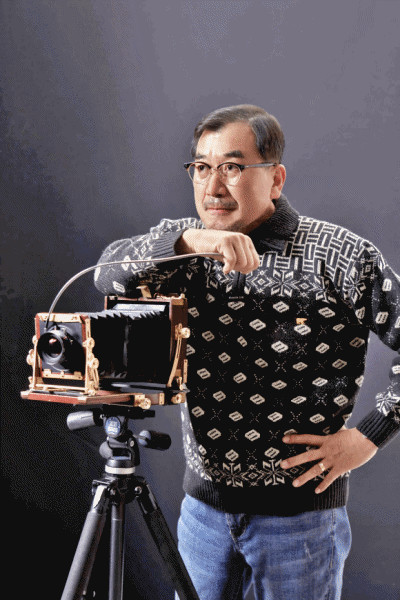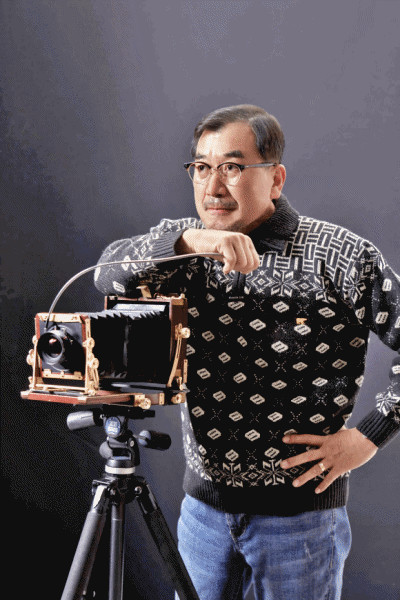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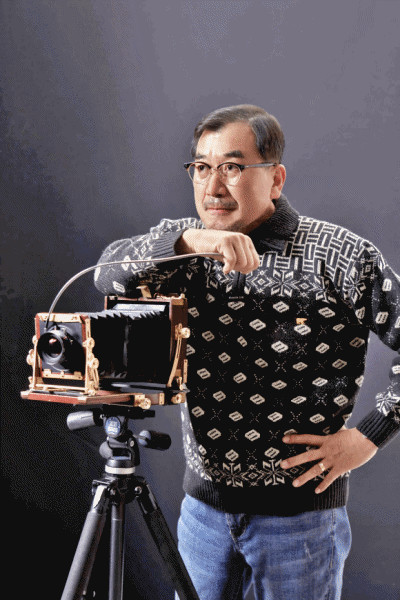 |
|
| ↑↑ 범초이 최형범작가 |
| ⓒ 문경시민신문 |
|
범초이 최형범 개인전을 5월27일 부터~6월2일 까지 문경문화원 전시실에서 통상20번째 작품전을 개최 한다.
1993년 계레의 얼굴 장승사진전을 시작으로 환경분야 사진전,나무와의 대화전(展) 등 서울예술대학 사진학과 1기생으로 연세대학교박물관 교육 전문가로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을 졸업(문화재)한 연극기자이자 자유기고가 이다.
상주가 고향인 최형범 작가는 2005경 문경으로 귀농을하여 문경의 산과 공기 환경에 매료되어 현재 문경읍 고요리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나무가 있는 풍경- 박영택(미술평론 경기대교수)
|
 |
|
| ⓒ 문경시민신문 |
|
오랫동안 돌/석인石人을 찍어왔던 작가의 근작은 한결같이 나무다. 흑백으로 촬영된 수직의 나무들은 주변의 풍경을 지우고 단독으로, 집단으로 직립해 있다. 집 근처, 논이나 밭 주변, 혹은 산이나 들판에 흔하게 서있는 그런 나무들이다. 특별히 멋들어지거나 웅장하거나 그럴듯한 자태를 지닌 것들도 아니고 특정 나무에 얽힌 관념도 지워진 그저 그런 범속한, 비근한 나무들의 초상이다. 다만 보잘 것 없거나 일상 속에 흩어진 나무들을 새삼스레 주목하면서 그것과 대화를 나누듯이 찍어나가고 있다.
작가는 자신의 집 주변의 나무들을 찍었다. 구체적으로 반경 21km이내의 나무들이 그의 눈에 걸려든 것이다. 새벽 5시면 눈을 떠 밖으로 나가 만난 나무들이다. 그것들은 대부분 흐리고 안개가 끼고 궂은 날씨 속에 어렴풋이 드러나는 나무의 물성과 형상을 지닌 체 적조하다. 명료한 가시성의 세계와 빛에 의해 또렷이 부감 되는 나무를 억누르고 다소 불명료한, 습기가 차고 안개나 진눈깨비 혹은 부슬비가 내리는 속에서 늘상 그렇게 서있는 나무를 찍은 것이다. 새벽이나 해가 기운 시간대의 나무들이다. 사계절의 변화와 다양한 시간의 누적 속에 그 나무들은 재현된다.
작가가 자신이 집 근처 나무들을 찍고 있다는 말을 듣고 생각이 났다. 우리 옛 사람들의 공부방법 중 하나가 자기 주변의 나무를 하나씩 헤아리는 일이었다고 한다. 마당으로부터 시작해 집밖과 논과 밭 주변, 근처 야산이나 동네 혹은 더 멀리 나아가면서 눈에 띄는 모든 나무를 일일이 세어보고 그 종류를 가늠하고 그것들을 가슴과 머리 속에 넣어두는 일이었으리라. 이른바 ‘격물치지’의 수행법이기도 하고 ‘근사’近思에서 출발해 깨달음에 이르는 선인들의 지혜와 공부방법을 말해주는 듯 하다. 선인들은 자기 주변의 모든 것들 모든 것들, 그러니까 풀 포기 하나, 돌멩이 하나, 다양한 식물과 곤충, 나무들을 유심히 보고 그 생의 이치를 헤아리며 우주의 비밀을 가늠해왔다. 그것들과 대화를 나누며(대칭적 사유) 생명의 온전한 의미를 깨달아갔던 것이다. 그로부터 인간의 문화를 그려왔다. 그 수행법의 하나로 산수화를 그리고 사군자를 치거나 난을 키우고 수석을 완상 하였던 것이다. 평생을 대나무와 매화, 난이나 돌멩이와 함께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의미를 새삼 오늘에 와서 생각해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도 같다.
범최는 자신의 살림집과 작업실까지 왕복하는 동안, 그 공간(21km)에서 매일 같이 만나고 보고 만지고 느꼈던 나무를 하나씩 기록해두었다. 물론 나무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대상을 찍어두었다. 이번에는 나무만을 모아서 전시를 꾸몄다. 어쩌면 작가는 그 나무에서 결국 자신의 초상을 본 듯하다. 주어진 공간에서 반복되는 일상을 겪어나가며 그 안에서 생의 의미와 이치를 헤아리는 일이 나무나 작가 자신이나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식물성의 것들은 정주하면서 세상을 안으로 수렴하고 불러들인다. 동물성과 달리 제 스스로 생을 완성해나가는 식물성의 나무는 지표에서 허공으로 제 몸을 가까스로 밀어 올리면서, 온 몸의 가지들을 죄다 부채살처럼 펼치면서 우주의 기를 빨아들인다. 그 모습이 엄정하고 숙연하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간의 몸은 저 나무 하나에 비해 더없이 비루하다. 작가는 그렇게 나무를 보았다. 아울러 한국인과 나무, 한국 문화와 나무를 떠올려보았다. 한국인의 삶과 문화 속에서 아득한 생애를 살아왔던 나무를 지금 어떻게 볼 것인가? 그는 그런 화두 하나를 지니며 살립집과 작업실을 왕복하며 매번 질문한다. 그리고는 카메라의 조리개를 열었다. 거기 나무 한 그루 오롯이 들어선다.
|
 |
|
| ⓒ 문경시민신문 |
|